천원짜리 검은장갑 한켤레와 겨울나기
[광화문단상] 지독한 추위 장갑보다 더 그리운 게 사랑인 모양
천원짜리 검은장갑 한켤레와 겨울나기[광화문단상] 지독한 추위 장갑보다 더 그리운 게 사랑인 모양저는 장갑을 두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가갈 때 각시가 사준 겁니다. 가죽으로 만든 건데 꽤 비싸게 샀을 겁니다. 그런데 제 손엔 좀 헐겁습니다. 감히 어찌할 수 없어 서랍 어디엔가 모셔두고 있습니다. 끼고 다니는 건 천 원 짜리 검은 장갑입니다. 지하철에 가면 보따리장수들이 파는 거죠. 참 따뜻합니다. 손에도 딱 맞고요.
몇 해 전입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잘릴 뻔했던 때였습니다. 높으신 분에게 찍혔다고나 할까요. 집에 틀어박혀 나름의 항의를 하던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있던 한 친구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집 앞이라며 대뜸 나오라는 겁니다. 위문이었죠. 허름한 삼겹살구이 집이었을 겁니다. 소주 한 잔 하려고 화덕처럼 생긴 술상에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그 친구가 검은 장갑 한 켤레를 내밀며 한 마디 하더군요. “지하철 타고 오면서 니 생각나서 샀어. 싸구려야. 아저씨들이 천원에 파는 거야. 니꺼와 내꺼 두 켤레 샀지.” “전철에서 니 생각나 샀어”
장갑이 따듯했을까요? 하여튼 그 날 이후 전 손이 시리면 그 장갑을 낍니다. 몇 군데 터진 실밥이 너덜거리기도 하지만 겨울철 제주머니엔 언제나 그 장갑이 자리하고 있답니다. 그나마 며칠 전 아들놈한테 뺏기고 말았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운 날이 잦습니다.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기에 웬만하면 장갑을 끼지 않는 저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인가 그 장갑을 끼고 전철에 앉아 있다 문득 그 친구를 기억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텐데 잘 사는지 연락이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천 원짜리 장갑 한 켤레지만 참 여러 해 내 손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아마 그 친구에게 느끼는 고마움 때문이겠죠? 그 날 전 싸고 질 좋은 물건을 만든 이들 생각도 좀 했습니다. 장갑 한 켤레를 천원에 팔아 어찌 먹고 사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날 제가 지하철에 앉아 장갑생각을 한 건 빨간 벙어리장갑을 낀 꼬마를 보고서였습니다. 토끼털처럼 생긴 게 붙어있어 따뜻하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새 거라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꼬마는 장갑을 벗지 않았습니다. 제 볼과 엄마 볼에 번갈아가며 문지르면서요. 빨간 벙어리장갑을 낀 꼬마 벙어리장갑을 낀 기억이 어렴풋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때였을 겁니다. 그 꼬마 장갑처럼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황토색 실로 짠 건데 아마 누나가 손뜨개를 한 것이었을 겁니다. 조금 삐뚤어지고 촘촘하지 않아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거였죠.
요즘처럼 고운 털실도 아닙니다. 색깔도 왜 그리 칙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릴까봐 양쪽을 긴 실로 연결해놓았죠. 잘사는 애들이 끼던 시장에서 산 장갑이 왜 그리 부러웠던지 모르겠습니다. 실밥이라도 한 올 터지면 “이게 뭐냐”며 내 던졌을 겁니다. 누나 사랑이 추위를 녹인다는 사실을 알 턱이 없었으니까요. 그 때 간절히 원했던 건 손가락장갑이었습니다. 어른들만 끼고 왜 나에겐 벙어리장갑을 주는 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기야, 비오는 날이면 살이 두어 개 내려앉고 한쪽 천이 찢어진 우산을 쓰고 학교 가며 하루 종일 퉁퉁 부어 있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어쨌든 벙어리장갑이 싫다고 투덜거리면 엄마는 그게 더 따뜻하다고 그랬습니다. 손이 모여 있으니 그렇다는 거였죠.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 땐 그냥 그렇게 믿었죠. 살 돈이 없고, 손뜨개로 손가락장갑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손가락장갑 타령에 퉁퉁 부어... 미처 생각 못했던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름입니다. 왜 벙어리장갑이라 했는지 궁금해 하지 않았으니까요. 청각장애자를 벙어리라 하는데, 요즘은 그리 부르면 실례잖아요? 그러니 왜 그리 이름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손가락장갑에 비해 만들기는 쉬웠을 겁니다. 벙어리장갑의 추억은 나만의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미국에서도 어린이에게 ‘벙어리장갑’(The Mitten) 만화동화가 인기 최고라는 군요. 국내에는 ‘털장갑’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됐을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래동화를 멋진 그림으로 표현한 젠 브렛의 작품입니다.
닉키는 어느 날 할머니 바바가 짜준 눈처럼 흰 벙어리장갑을 끼고 땔감을 모으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장갑 한 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얀 눈과 구별이 안 돼 찾을 수가 없었죠. 한데 숲 속 동물들 눈엔 곧 띠었고, 신기하고 좋았던 모양입니다. 두더지가 먼저 발견하고는 안으로 들어가 자리 잡습니다. 이어 토끼, 고슴도치, 부엉이, 오소리, 여우가 들어갔고요. 곰까지 비집고 들어가도 장갑은 늘어나고 따뜻했답니다. 맨 마지막으로 온 쥐가 곰 콧등에 앉았는데 가려웠던지 곰이 그만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벙어리장갑이 터지며 날아갔습니다. 닉키는 그 때서야 장갑을 발견했고요. “좌절에서 구하는 건 사랑” 뭐 그리 대단한 동화도 아닙니다. 할머니가 털실로 짜 준 벙어리장갑이 따뜻하고 소중하다는 메시지 정도를 전해주는 정도랄까요. 작가는 애초 일러스트를 공부한 사람이고 내용 또한 그녀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다만, 그림이 꽤 어린이들의 눈길을 끌었던 모양입니다.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누군가 크게 좌절할 때 실의에서 극복하는 원동력 중 하나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따뜻한 사랑이라고 그러더군요. 설마 부모만이겠습니까? 친구, 선생님, 연인 누가 전했든 따뜻한 사랑이라면 왜 아니 그러겠습니까? 우수(雨水)입니다. 입춘을 지난지가 벌서 보름입니다. 우수·경칩엔 대동강 물도 풀린다고 그랬습니다. 날씨가 풀리고 봄바람이 불며 새싹이 나는 때라고요. 텔레비전을 보니 좀 풀린다는데, 여전히 손이 시립니다. 이 추위엔 장갑보다 더 그리운 게 사랑인 모양입니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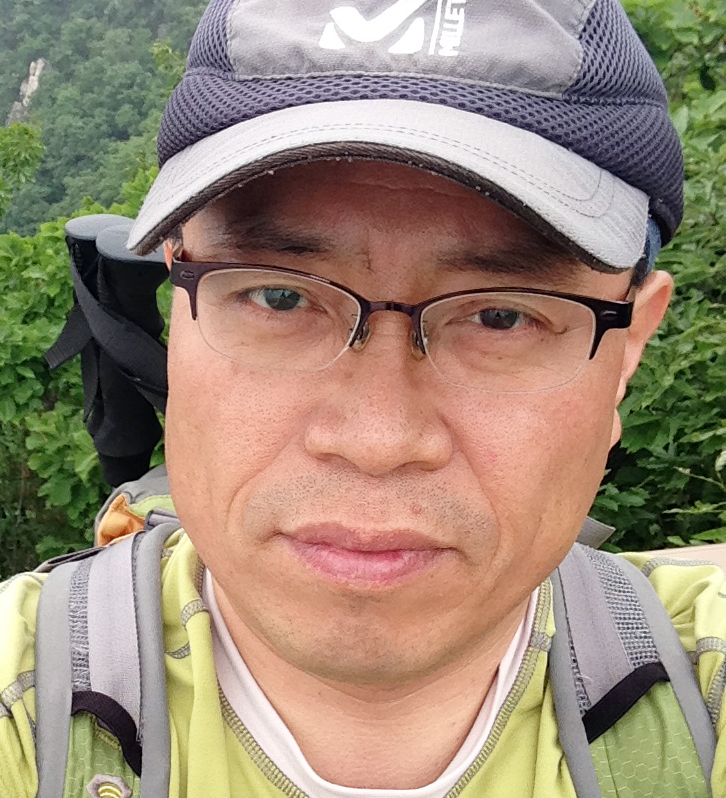 평화를 사랑하는 최방식 기자의 길거리통신. 광장에서 쏘는 현장 보도. 그리고 가슴 따뜻한 시선과 글...

댓글
광화문단상, 검은 장갑, 천원짜리, 겨울나기, 사랑,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최방식 기자의 길거리통신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