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앞둔 가을산은 여행자의 철학책
[길거리통신] 시련·인고의 세월 이기고 ‘무문관’ 나설 수도자되라는...
‘이별’ 앞둔 가을산은 여행자의 철학책[길거리통신] 시련·인고의 세월 이기고 ‘무문관’ 나설 수도자되라는...다시 길을 나섭니다. 늘 다녔건만 그 길이 아닙니다. 그 길 어딘가에서 우리는 만나고 헤어집니다. 세상만사가 다 그렇듯이요. 의당, 소중하고 새로울 밖에요. 행여, 처음 들어선 길은 행운입니다. 새 인연을 만드니까요. 하여, 낯선 길만 고집한다고요? 엉터리입니다.
토요일이면 등짐을 지고 집을 나서는 까닭입니다. 특별한 소식이 없으면 청량산으로 향합니다. 햇볕이 간절할 땐 버스를 탑니다. 그늘이 그리울 땐 전철로 가고요. 물통 하나, 카메라 하나 짊어지고. 은행나무 구린 냄새는 잠깐입니다. 지나치는 것이기에. 것도 가을에만.
창가 휴대폰을 든 더벅머리 청년 손가락은 정말 달인입니다. 이어폰 낀 단발머리 여중생은 부끄럼이 없습니다. 침이 튀는 줄도 모르고 수다 삼매경에 빠진 아줌마들은 신명 수준. 어깨가 축 처진 꼬마는 토요일에도 학원엘 다니는 모양입니다. 가방 가득 엄마·아빠를 짊어지고서요. “낯선 길만 고집한다고요?” 문득 종점입니다. 뚜벅이 산행을 시작하는 데지요. 내려올 때 들를 주막집을 봐두는 건 돌아오려는 자의 예의죠. 오르기도 전에 막걸리 한 잔이 간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쪽’이 신날 때가 많거든요. ‘저쪽’의 그늘과 고독에 비하면요. 삼수갑산 길을 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행자는 저쪽 여정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쌓고 감추는 이쪽을 잠시 버려도 되니까요. 저쪽으로 들어서면 침잠했던 자아가 일어섭니다. 몸이 낯설어지기 시작하죠. 타자를 버리고 깊고 깊은 그늘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시작하는 거죠. 그냥 쭉 가면 됩니다.
산은 눈치도 빠릅니다. 이별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매미 울음이 이젠 아련합니다. 햇볕은 따갑고요. 너무 아파하지 말라는 예고인 것이지요. 벌써, 헤어짐이 ‘아름다운 인연’이라고 다독이는 것이지요. 새 생명을 잉태하려면... 멋모르는 까치만 요란하게 그저 울어댑니다. 길은 갈라집니다. 밝은 길과 그늘 진 길. 반듯한 길과 굽은 길. 가파른 길과 평탄한 길, 북적이는 길과 한가한 길. 마주할 때마다 고민에 빠지지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둘은 딴 길이 아니거든요. 다 이어져있으니까요. 알 턱이 없으니 망설이는 거지요. 길이라 하면 길이 아니고, 있다 하면 없다는 노자(老子). 사물을 제 눈으로 봐야 곧이듣는 범부에겐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이 제격인 겝니다. 닫으면 딴 세상이지만 열면 하나라는 데리다의 ‘문’이야기까지 가면 정말 얼어붙는 거지요. 현자와 철학이 새삼스러워지는 땝니다.
‘헤어짐’이 아름다운 인연 생명사상을 말했지요. ‘그늘의 미학’을 설파한 김지하 선생 말이 절실하더이다. 제아무리 멋지게 포장해도 “그늘이 없어” 그 한 마디면 꽝이라고 했다지요? 찬란함 저편 어둠(그늘)과 참담함을 모르면 빛이 나질 않는다지요. ‘흰그늘’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면서요. 여행자가 길 위에 서는 까닭은 분명합니다. ‘저쪽’을 알고 싶어서죠. 그리하면 ‘이쪽’이 더 잘 보이니까요. 이 길이 저 길, 그리고 그 길로 이어졌음을 깨닫는 것이지요. 길 아닌 곳을 보면서요. 길 밖에서 길을 보듯이. 밝은 곳을 보면서 그늘진 곳을 이해하듯이. 가을 산은 빛과 그늘의 천국입니다. 볕이 아직 더 필요한 생명은 그러니 난리법석입니다. 그늘진 뭇 생명은 어둠을 준비하느라 바쁘고요. 이쯤 카메라 렌즈가 쓸모 있으려나 싶어 꺼내보지만 무용지물입니다. 범부가 눈을 씻고 들어다 봐도 ‘존재’를 보지 못 하 듯이요.
길을 나서는 건 그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 그리고 어둠속 그 무엇을 담지 못하는 렌즈를 믿을 수 없으니까요. 빛 속에 빨려들고, 어둠 속 나락으로 곤두박질치는 건 그러니 운명인 셈입니다. 빛과 어둠의 저편을 감지하려는 것일 테니까요. 발품이 깨달음입니다. 아름다움과 추함, 빛과 어둠의 조화는 이제 세상을 긴 어둠의 터널로 끌어들입니다. 찬란한 그 가치를 확인시켜주려는 것이지요. 양자의 고마움을 보충대리하려고요. 시련과 인고의 세월을 지내고 ‘무문관’을 나서는 수도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데리다의 문’ 앞에선 수도자 문고리를 굳게 걸어 잠그고 긴 동안거의 그늘 속으로 침잠하는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낯선 길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깨달고 ‘아!’ 감탄사를 낼 당신은 ‘현자의 돌’을 거머쥔 연금술사가 되는 겁니다. 지났던 그 길. 반복이 아니었음을 알았으면 기껏 ‘엉터리’신세를 면하는 겁니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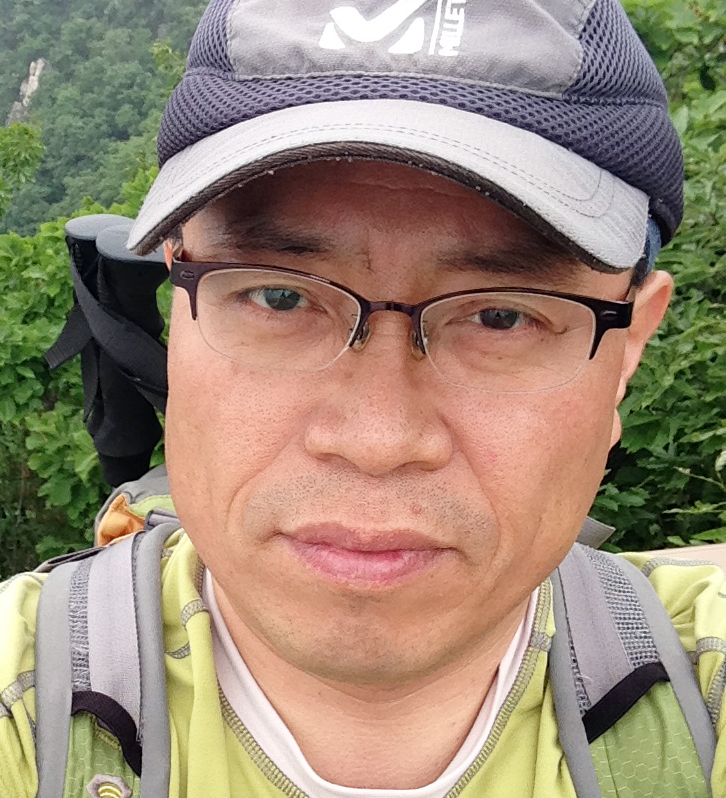 평화를 사랑하는 최방식 기자의 길거리통신. 광장에서 쏘는 현장 보도. 그리고 가슴 따뜻한 시선과 글...

댓글
길, 여행, 길거리통신, 데리다, 노자, 연금술사, 가을산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최방식 기자의 길거리통신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