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모를 꽃? 개망초지요 ‘구름국화’
[지리산 둘레길기행④] 길손에겐 만나는 모두가 소중한 인연
이름 모를 꽃? 개망초지요 ‘구름국화’[지리산 둘레길기행④] 길손에겐 만나는 모두가 소중한 인연<지난 글에 이어> 길을 가다보면 많은 길동무를 만납니다. 길 위에서 동행하거나 스쳐 지나가는 동무도 있고 그저 길을 가다 마주하는 뭍 생명과 자연들도 있지요. 길을 나선, 그리고 길을 가는 나그네의 즐거움이지요. 피할 수 없는 인연이기도 하고요.
부모가 인생길에 가장 먼저 마주한 인연이라면, 어린 시절 죽마고우들과 사회에서 맺은 친구·연인·선후배·동료, 그리고 배우자·자식은 그리 길지 않은 인생역정에 맺어지는 가지각색의 인연입니다. 동식물과도 마찬가지죠. 그 중 아름다운 인연을 들라면 꽃 아닐까 싶군요. 여행중 마주하는 꽃들은 즐거움입니다. 지리산을 가면 어느 길에서든 수많은 야생 꽃들을 보게 되지요. 중군마을을 지나 황매암 어딘가를 가다 분홍색 자태를 자랑하는 금낭화를 봤습니다. 잎사귀는 싸리 같고 꽃모양은 아카시처럼 생겼는데 색깔은 전혀 딴판입니다. 며느리밥풀꽃? 아니 금낭화 한 여름 뜨거운 햇살을 받고 숲 길 한쪽 귀퉁이에서 곱디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며느리주머니’라는 별명의 흔하디흔한 양귀비과 꽃이라는 데, 식생에 문외한인 제가 그 걸 기억하는 덴 이유가 좀 있죠. 누군가 ‘며느리밥풀꽃’이라 해 귀를 쫑긋 세운 적이 있거든요.
금낭화를 가리켜 분홍 꽃 잎 아래쪽 둥글고 하얗게 매달린 걸 밥풀 두 알이라 설명할 땐 진지했죠. 꼭 그래 보이더군요. 이름도 희한하고요. 시어머니 구박에 죽은 며느리가 원한을 달래려 하얀 두 알의 밥풀을 물고 그리 피어났다는 소리엔 얼마나 측은했는지... 좀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야 그런 사실도 알았지만요. 이름을 잊을 수 없어 언젠가 전문가에게 물었더니 그리들 많이 오해한다는 군요. 가시 달린 진짜 ‘며느리 밥풀꽃’과 모양이 비슷해서 그렇다나. ‘며느리주머니’, ‘며늘치’라는 별명의 금낭화(錦囊花)라면서요. ‘며느리...’ 이름을 가진 꽃들은 기이한 꽃말 때문인지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더이다. 슬픈 유래를 간직하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밥 지으며 뜸 들었는지 확인하려다 “어디 감히, 어른 손도 안 된 밥을 제 입에 먼저 넣어”라는 구박에 명줄을 놓아버린 며느리의 한으로 피어난 ‘며느리밥풀꽃’을 포함해서요. 움푹 들어간 잎사귀가 얄미운 며느리 배꼽을 닮았다고 해 이름 붙여진 ‘며느리배꼽’은 그래도 나은 편. 잎사귀 주위에 작은 가시가 있어 ‘밑씻개’로 쓰기 곤란한 ‘며느리밑씻개’. 밭일 중 급한 볼일 뒤 뒤처리할 게 없을 때 풀 잎사귀를 사용하는데, 미운 며느리에게 그 걸 쓰라고 했다는 얄미운 시어머니의 구박이 한가득 담긴... 꽃 이름이 한풀이인 셈입니다. 진혼이라고 해야겠군요. 얄미운 시어머니 몰래 며느리들이 그리 불렀을까요? 한 서린 며느리의 넋을 위로하려고 그리 이름 지었을 수도 있겠군요. 세상에 어디 그런 얄미운 시어머니와 박복한 며느리만 있었겠습니까만 꽃 이름이 그리 나붙은 걸 보면 기구한 사연만큼은 짐작할 성 싶습니다. 시어미 구박 ‘며느리밑씻개’ 길 떠난 여행자들에게 꽃은 유혹입니다. 사람, 마을, 자연, 그리고 역사와 소통하는 길. 그 길에는 여행자가 있고, 여행자 주변엔 늘 유혹이 깃들지요. 유혹의 인연은 요염한 미모를 뽐내면서요. 사랑으로 소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생명을 이어놓자는 섭리지요.
여행자는 꽃 이름도 모르고 눈길 한번 주고 스쳐지나갈 지 모르지만 둘은 거기서 꼭 조우하도록 운명 지워졌습니다. 어딘가를 향해 떠나는 길손. 그 길손을 붙잡았다 끝내는 떠나보내는 마을과 자연 그리고 뭇 거주자들. 길이, 꽃이, 그리고 길손이 거기 있는 이유입니다. 바람이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라면 여행자는 생명을 잇는 메신저입니다. 길손은 도로 위에도 있지만 숲속에도 창공에도 그리고 깜깜한 대자연의 품안에도 존재합니다. 제 목숨을 다하는 그 시각까지 발걸음을 재촉하면서요. 여정이 긴 이가 있으면 짧은 이도 있습니다. 각시원추리, 꽃무릇, 백일홍, 찔레꽃, 뱀딸기꽃, 개미취, 개불알꽃, 갯패랭이꽃, 엉겅퀴, 금강초롱꽃, 쑥부쟁이, 꽃창포, 구절초, 노루오줌, 더덕, 도라지꽃. 어느 이름 하나 잊으면 안 됩니다. 꽃 이름을 잘 모르거든 식물도감이라도 하나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저마다의 아름답고 고운 자태가 있는 데 함부로 ‘이름 모를 꽃’이라고 부르지 마시라는 거죠. 제아무리 모자라 보이고 개성 없어 보여도 ‘행인’이라거나 ‘무명씨’라고 부르면 안되듯이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럼 꽃은 무엇을 남길까요? 이름 모를 꽃, 이름 모를 새라고 하지 말라는 꾸짖음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 이름 없는 꽃이나 새는 없는데, 문인들이 얼마나 게으르고 무식하면 제 주변에 사는 꽃·새 이름도 모르며 글을 쓰느냐는 거죠. ‘무명화’라던 이들보단 그나마 나은 건데, 길든 짧든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국화를 구름처럼 모아놓은... ‘서울아이들’(윤동재 글)이란 노래엔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서울 아이들에게는 질경이 꽃도 이름 모를 꽃이 된다. 서울 아이들에게는 굴뚝새도 이름 모를 새가 된다. 서울 아이들에게는 은피라미도 이름 모를 물고기가 된다. 말도 마라 이제는 옆집 아이도 이름 모를 아이가 된다.”
게으름만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좀 고약한 표현을 동원하자면 이렇습니다. “제 에미 애비도 못 알아본다.” 가장 질긴 부모자녀 인연조차 구별 못 한다는 욕인데, 제 집 제 삶 주변에 늘 피고 나는 꽃과 새를 모른다는 건 말하자면 꼭 그런 셈입니다. 고백 하나 하죠. 개망초라고 아시나요? 기자는 최근까지 몰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논밭에 가장 많이 봤던 들풀이며 여름이면 훤칠한 키에 수십개의 손톱만한 국화 닮은 꽃을 무수히 피우던 귀화종 풀과 꽃. 강인한 생명력으로 이주·이민에 성공한 그 식물... 둘레길 가에 가장 많이 피었습니다.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구름국화. 안개꽃 생각나죠? 꽃인 듯 아닌 듯 주인공 꽃을 수백개로 둘러싸 아름답게 하는... 매혹적인 맵시나 향은 없지만 구름처럼 모아놓은 국화송이들. 실망초·망초라고요? 봄에는 나물로, 뿌리는 열을 내리고 해독·소화를 도와 장염·간염·소화불량에 특효가 있다는 데도요? <다음 글 계속>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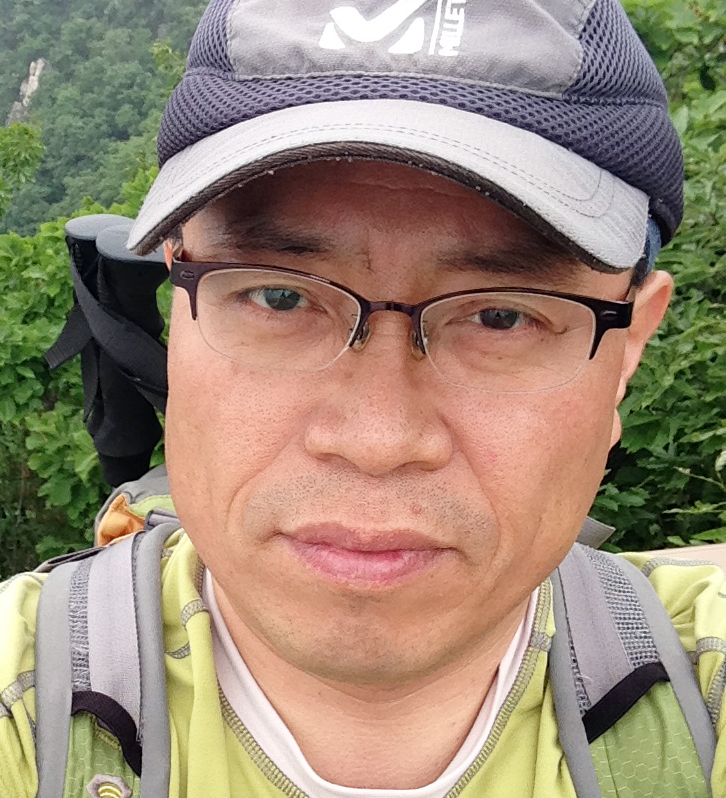 평화를 사랑하는 최방식 기자의 길거리통신. 광장에서 쏘는 현장 보도. 그리고 가슴 따뜻한 시선과 글...

댓글
지리산 둘레길 기행4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최방식 기자의 길거리통신 많이 본 기사
|






























